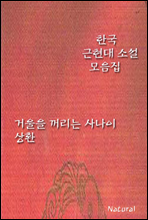상세정보

장벽 : 꼭 읽어야 할 한국 대표 소설 34
- 저자
- 계용묵
- 출판사
- 더플래닛
- 출판일
- 2015-12-15
- 등록일
- 2018-12-12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135 Bytes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짚을 축여 왔다. 그러나 손이 대여지지 않는다. 어서 새끼를 꼬아야 가마니를 칠 텐데 - 그래야 내일 장을 볼 텐데 - 생각하면 밤이 새기 전에 어서 쳐야, 아니 그래도 오히려 쫓길 염려까지 있는데도 음전이는 손을 대기가 싫었다.
맴을 돈 것같이 갑자기 방안이 팽팽 돌며 사지가 휘주근하여지고 맥이 포근히 난다. 왜 이럴까 미루어 볼 여지도 없이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생리적인 징후가 또 사람을 짓다루는 것임을 알았다.
가마니를 쳐서 빨간 댕기를 사다 지르고 설을 쇠리라, 그리고 고무신도…… 하고 벼르고 별러 오던 설날, 그 설날은 이제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은 섣달 그믐의 대목 장날이다.
음전이의 마음은 괴로웠다. 조용히 감은 눈앞에는 빨간 댕기가 팔랑거린다. 콧등에 파아란 버들 이파리가 쪽 갈라붙은 분홍 고무신이 보인다. 그리고는 그 댕기를 지르고, 그 신을 신고 뛰어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놀을 즐거운 그날이-.
그러나 몸은 점점 더 짓다른다. 좀 누웠으면 그래도 멎겠지? 마음을 늦먹고 자위를 하여 보나 소용이 없다. 머리는 갈라져 오고 아랫배는 결결이 쑤신다. 이번 설에도 댕기를 못 지르나? 새 신을 못 신나? 생각을 하니 이를 데 없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