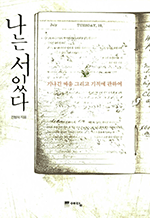상세정보

일생에 한 번쯤은 파리지앵처럼
- 저자
- 황희연
- 출판사
- 예담
- 출판일
- 2009-12-11
- 등록일
- 2008-07-0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한 저녁이었다.
가랑비가 먼지처럼 가늘게 흩어졌다.
사무실에 혼자 있던 나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터덜터덜 밖으로 기어나왔다.
가랑비가 티셔츠 사이로 소리 없이 밀고 들어왔다.
시원했다.
그날 나는, 내가 곧 이 치열한 마감 전선에서 물러날 것임을 예감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고 있었고, 처방전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너무 오래 현실에 머물렀던 거야. 이젠 좀 더 용감해지고 싶어.”
가랑비 사이를 한참 걸어다니던 서른여섯 살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떠나는 거야! 어디로든, 아무렇게나.”
반듯했던 삶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 떠난 배낭여행
지금 필요한 건 호흡을 고르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일이다!